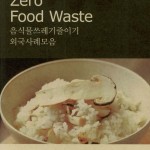[영화 이야기]
알바트로스야, 미안해
⊙김지은
사는 곳: 세종시
좋아하는 것: 누워서 뒹굴 거리기
잘하는 것: 자료 분류 및 문서 작성
환경실천 한지: 텀블러, 손수건, 장바구니 3종 셋트 사용 7년
 알바트로스. 이 멋진 이름을 가진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멀리, 높이 나는 새로 양 날개를 편 길이가 3~4m나 되며, 두 달도 안 돼 지구를 일주하고,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도 6일 동안 날 수 있다. 게다가 어린 알바트로스는 한번 날아오르면 성체가 되어 번식을 위해 돌아오기 전까지 땅을 밟지 않고 바다 위를 날거나 바다에서 쉬는데 대개는 3, 4년이지만 무려 10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말 이런 새가 있다니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전설을 대하는 느낌이 든다.
알바트로스. 이 멋진 이름을 가진 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멀리, 높이 나는 새로 양 날개를 편 길이가 3~4m나 되며, 두 달도 안 돼 지구를 일주하고, 날개를 퍼덕이지 않고도 6일 동안 날 수 있다. 게다가 어린 알바트로스는 한번 날아오르면 성체가 되어 번식을 위해 돌아오기 전까지 땅을 밟지 않고 바다 위를 날거나 바다에서 쉬는데 대개는 3, 4년이지만 무려 10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정말 이런 새가 있다니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전설을 대하는 느낌이 든다.
영화 ‘알바트로스’를 통해서 그저 이름만 스치듯 들었던 이 새가 얼마나 놀랍고 매력적인 새인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 새의 비극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그랗고 맑은 눈에 신뢰를 담고 평화롭게 다가오던 이 사랑스러운 새의 생명을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싶은 진실을 확연히 보게 되었다.
알바트로스는 춤을 추며 짝을 찾고는 때론 60년 이상을 평생 부부로 살면서 2년마다 하나씩 알을 낳는다. 이들은 서로 교대로 알을 품으며,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올 때 껍질을 대신 깨주지는 않지만 노래를 부르며 용기를 북돋워준다. 새끼가 자라는 동안 이들은 보통 한 번에 1600킬로미터나 날며 지극정성으로 새끼를 돌본다. 그들의 조상이 수백만 년 동안 해왔듯이 바다를 믿고…. 어미새는 플라스틱을 새끼의 뱃속에 그대로 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북태평양 미드웨이섬에 8년 동안 오가며 이 영화를 완성했다는 크리스 조던은 영화에서 그렇게 죽은 새를 보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가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은 자기는 알지만 알바트로스는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것. 또한 그는 자기가 이렇게 알바트로스를 사랑하게 될 줄도 몰랐다고 한다.
‘애도는 슬픔이나 절망과 다르다. 애도는 사랑과 같다.’
그의 나레이션을 들으며 이 영화 자체를 죽어간 알바트로스들에게, 우리 인간이 훼손시켜 놓은 모든 자연의 존재들에게 애도의 마음으로 헌정한 것이 아닐까. 비록 죽은 알바트로스의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들어있던 플라스틱을 낱낱이 꺼내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지만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보다는 미술 작품처럼 예쁘게 재배열하고 꽃으로 둥글게 장식하여 만다라 이미지와 겹치게 하였으며, 흰제비갈매기, 파란 하늘과 바다, 섬의 풍경 등이 부드러운 선율의 음악과 잘 어우러져 한편의 아름다운 자연의 시를 감상한 것 같았다.
크리스 조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슬픔을 외면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되 절망과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모든 자연의 존재는 그 자체로 아름답고 고귀함을 보여주고자 했고 이들을 지켜내고자 직면할 용기를 냈던 것은 아닐까.
이것은 단지 알바트로스의 문제가 아니다. 비닐, 플라스틱, 금속 중독 등 환경오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 미세먼지로 따뜻한 봄날의 산책이 두려워진 우리들. 모두의 뱃속은 깨끗할까?
알바트로스가 긴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가르며 하늘로 날아올라 자유롭게 날고 사랑하고 새끼를 키우며 평생을 해로하며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의 자연스로운 삶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한 인간으로서 알바트로스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다.
알바트로스야 미안해. 너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더 이상 이대로 살진 않을게. 지연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의 긴 행렬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도록 그리고 마침내 멈출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게. 부디 행복하기를.
*에코붓다 소식지 2019년 11-12월호에 실린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