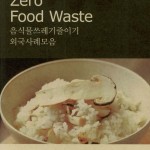당신이 에코붓다
당신이 에코붓다
천천히 천천히, 자연의 속도에 맞춰 살아요
서미원 아태유럽 1반
서미원 님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자리를 잡은 것은 20여 년 전. 그전에는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무원 사회도 인원 감축의 파고가 쳤고, 미혼인 자신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겼는데 그게 바로 뉴질랜드였습니다.
“카우리 나무 때문이었어요. 푸른 나뭇잎이 햇빛을 받아 물비늘처럼 반짝반짝하는데 처음 본 순간 저도 모르게 함성이 나왔어요. 아주 천천히 자라는데, 여기에는 2천 년이 넘은 카우리 나무도 있어요. 언제나 반짝거리는 그 나뭇잎에 반해서 이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 바느질 좀 하면서 인터뷰해도 될까요? 친구 생일에 옷을 한 벌 선물하기로 했거든요.”
화상 인터뷰를 청하자, 서미원 님은 묵직해 보이는 손재봉틀 앞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릴 적 까무룩 하게 잠이 들면 “드르럭” 엄마의 발 구름에 맞춰 앞서거니 뒤서거니 옷감을 밀어내던 옛날 그 재봉틀이었다.
“한국에서 중고로 사서 뉴질랜드까지 같이 왔어요. 요즘에 나오는 전기 재봉틀은 저 혼자 스르륵 밀리는데 그 속도에 따라 갈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고요. 조금 느려도 한 땀 한 땀 제 정성으로, 제 속도로 옷을 지을 수 있는 이 구식 재봉틀이 저에게는 맞아요.
고요하고 멋스러운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행복
40여 년이 더 되었을 것이라는 재봉틀로 서미원 님은 자신의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다. 또 그 옷이 예쁘다고 눈을 못 떼는 친구를 위해 원피스도 하나 지어 선물하기로 했다. 그렇게 손수 바느질하며 남는 천들은 차곡차곡 모아서 남편과 자신의 홑이불을 만든다. 두 손 가득 펼쳐 보여주는 퀼트 이불은 알록달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 더 멋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품에 들어오면 물건이건 사람이건 인연이 끝나는 법이 없다.
“침대 시트 커버의 경우 오래 쓰다 보면 몸이 닿는 가운데 부분만 닳아요. 멀쩡한 테두리는 행주를 만들어 친구들과 나누어 쓰고, 군데군데 해진 가운데 천은 주변 자동차 정비하는 분들께 가져다줘요. 기름때 닦을 때 아주 요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미원 님은 완전한 버림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손을 떠난다고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어릴 때 쓰레기를 가득 실은 초록색 쓰레기차가 동네를 오가는 것을 보고, 저 많은 쓰레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는 한숨을 쉰 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해가 없는 버림이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버림이 아니라 나눔이다. ‘버림’보다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물건이 나에게 있을 때처럼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 다음으로 이 물건을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야 하기에 나눔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이들이 쉬운 버림을 택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늘 시간과 정성이 배어나야 하는 나눔을 선택한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버림이 아니라 나눔이다. ‘버림’보다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정성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물건이 나에게 있을 때처럼 사랑받기를 바라는 마음과 나 다음으로 이 물건을 사람에 대한 배려가 묻어나야 하기에 나눔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이 이들이 쉬운 버림을 택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녀는 늘 시간과 정성이 배어나야 하는 나눔을 선택한다.
“지금 뉴질랜드는 크리스마스 휴가철이에요. 자투리 천들과 털실 등을 이용해 에코백을 만들고 있어요. 넉넉히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려고요. 감자나 사과 같은 것을 살 때 여기서도 비닐봉지에 담아주는데 결국 다 버리잖아요. 털실로 뜨개질하고 남는 천으로 모양 내서 좀 신축성 있게 만들면, 비닐 대신 쓸 수 있는 예쁘고 실용성 있는 에코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설명:바느질하고 남은 천을 모아 만든 홑이불)
에코백 만들기가 끝나면 밀랍과 오일 등을 녹여서 일회용 비닐 포장지인 랩 대신 쓸 수 있는 다회용 포장지를 만들 계획이다.
“샌드위치 등 간단한 음식을 비닐랩으로 싸서 도시락으로 많이 들고 다녀요. 한 번 쓰고 버리는 랩 대신 물에 씻어 여러 번 쓸 수 있는 포장지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전에 프리마켓에서 파는 걸 봤는데, 직접 만들어서 주변과 나눌까 해요. 비율만 잘 맞추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육점에 갈 때도 통을 들고 가서 받아오는 그녀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자신을 비롯한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비닐을 되도록 적게 쓰는, 안 쓰는 생활을 할 수 있는지다.
밥 짓기가 복 짓기
얼마 전에는 알파카를 키우는 친구에게 털을 얻어왔다. 동물의 털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싫어서였다. 그 털을 모아 바늘꽂이를 만들면 특유의 단백질 성분 때문에 바늘이 녹슬지도 않고 오래간다.
“잡초가 묻고 똥이 묻어 어디에도 쓸 수 없는 털이었죠. 가져와서 물에 불려 깨끗이 씻어 말렸어요. 저는 또 그 남은 똥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깝더라고요. 모았다가 집 앞 텃밭에 뿌렸어요.”
집 앞에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한국 배추며, 알타리 등을 키운다. 스스로를 게으른 농부라고 부르며, 배춧잎은 달팽이와 나눠 먹는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텃밭으로 향한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자주 나오지는 않는다. 다른 집들이 일주일이면 채워 넘치는 20리터짜리 한 통을 두 달도 넘게 쓴다.
“얼마 전에는 수박을 샀는데, 초록색 껍질 부분만 얇게 벗겨내고 나머지 하얀 부분은 무말랭이처럼 구떡꾸덕하게 말렸어요. 칼칼하게 무쳐 먹었더니 참 맛있더라고요.”
여간해서는 돈을 쓰지 않지만, 유기농 먹거리에 대해서는 제값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약을 뿌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기에 착한 농부들이 그들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 좀 비싸더라도 착한 농산물을 제값에 사 먹어야 한다는 것. 대신 먹거리는 최대한 버려지지 않도록 한다.
“어릴 때 할머니께서는 수챗구멍에 밥알 내려가는 것만큼 흉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밥 짓기가 복짓기라고 음식 버리고, 밥알 버리는 것은 복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서미원 님의 환경 실천과 나눔의 마음은 그녀의 할머니에게 온 것인지 모른다.
“예전에는 밥 굶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집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오면 할머니는 한상 정성껏 차려서 드렸어요. 돌아가시는 길에도 곱게 만든 쌀 주머니를 가득 채워 드렸지요.”
내가 다시 살게 될 지구라고 생각하면
 환경 실천을 위해 늘 고민하고 배워나간다는 서미원 님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아주 쉬운 답을 들려주었다.
환경 실천을 위해 늘 고민하고 배워나간다는 서미원 님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아주 쉬운 답을 들려주었다.
“재미있고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인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도 너무 소중하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다시 올지도 모를 곳이라고.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네가 몇십 년 뒤에 혹은 몇백 년 뒤에 다시 와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곳인데 함부로 쓰면 되겠냐고 말해요.”
천천히, 천천히. 환경 보호란 주변의 나무와 풀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서미원 님의 눈빛은 정말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다.
(▲사진설명:환경실천에 큰 힘이 되어주는 남편은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